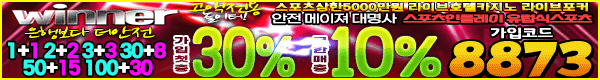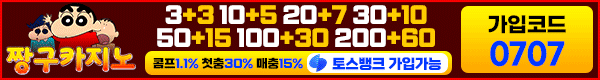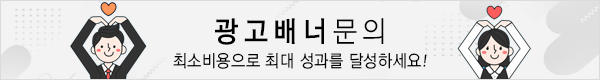갈등 - 14부
작성자 정보
- AV야동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4,008 조회
-
목록
본문
어우동은 넓은 탕에 몸을 담그며 휘몰아치는 물살을 온 몸으로 느끼는 듯 두 눈을 지긋이 감아 본다. 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온기가 무릎과 허벅지를 타고 전이되자 살포시 열탕의 물속에 몸을 담그며 세포 속으로 파고 드는 따뜻한 물 분자를 받아 들이는 듯 했다.
출렁이는 물결이 어우동의 목에 찰랑이자 굽혔던 발을 좌우로 벌리며 욕탕의 벽면에 머리를 기대는 자태는 조금전 개체로 탄생하여 물을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익숙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아, 따뜻해."
"기분이 좋으냐?"
"네, 편안하고 아늑한 것이 예전에 느껴 보지 못한 야릇한 감흥을 주옵니다."
"이제 몸을 한번 풀어봐야 하니 욕탕 밖으로 나오너라."
탕 밖으로 나온 어우동은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기에는 신경도 못쓴채 젖가슴을 두 손으로 가려 보려고 하지만 워낙 젖살이 통통하여 미처 가려지지 않은 구석이 많았다.
은밀한 채모가 송두리채 드러나며 작은 동산을 가린 소나무 가지처럼 울창하게 뻗어 있다.
"이리와서 눕거라."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걸음으로 물침대 위에 몸을 걸치는 어우동의 자태는 가히 천하일색이라 호색한인 내 마음 조차 벌써 진탕되고 있었다.
가녀린 어깨위로 한 팔을 올려놓고 바짝 다가가선 앵두같은 입술을 살며시 찍어 눌렀다. 쫀득한 느낌이 신선한 향내와 함께 코속을 파고 들었다. 다물어진 입술 사이로 부드럽게 혀를 넣어보니 달갑게 맞이 하는 또 다른 혀와 엉켜 버린다.
호흡을 멈추며 빨아대는 혀의 놀림에 다른 한 팔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껴 안아 본다.
개미허리를 안아쥔 듯 가슴팍에 빨려드는 어우동의 작은 몸은 어느새 딱딱한 돌기가 된 젖꼭지를 내 가슴에 부딪혀 온다.
찰진 젖가슴이 뭉쿨 다가오며 허리께를 조여주는 이상으로 몸에 안기는 것이 일품이라 어느새 호흡이 정지된 듯 강한 자극이 머리에 치달았다.
어깨에 올려진 팔을 목 뒤로 두며 머리채를 살짝 뒤로 젖히며 목젖에 뜨거운 입술을 가져가니 온몸이 팔딱이며 진동하듯 까물어치는 것이 웬만한 장정이라면 그 모습에 벌써 을 빼앗겨 버릴 것 같았다.
어느새 내 입술은 목줄기를 따라 뽀로뚱 솟아 버린 젖꼭지를 희롱하며 간지럽히고 빨아대니 어우동의 입에서는 단내를 풀풀내며 기묘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한다.
허리를 감았던 팔을 풀러 깊이 패인 배꼽 주변을 맴돌자 난데없이 가녀린 손이 다가와 더 아래 깊은 샘쪽으로 이끌어버린다.
촉촉하게 맺혀 있는 샘물을 찾아 유영하듯 손바닥을 그 곳에 마찰시켜본다. 뜨거움이 펄펄 솟아나며 진득한 애액이 손바닥 가득 묻어난다. 깊게 파인 골을 따라 중지를 이동시켜보니 조갯살이 반란을 일으킨 듯 솟구치며 스치는 손가락을 물어오는 것이 여간 감미로운 것이 아니다.
오소장이 작품을 만들었다.
명기중의 명기라며 조심할 것을 당부한 그 곳은 미쳐 처녀를 뚫기도 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치열함이 있었다.
매끄러운 허벅지로 이동한 손은 무릎위에 머문 채 살짝 조이고 풀며 어우동의 반응을 살폈다. 전혀 감각이 없을 이곳은 오히려 성감대 이상의 간지러움을 전하며 어느새 두 팔이 허우적 거리는 기 현상을 연출한다.
내친김에 천하명기 어우동의 그곳에 날카로운 입술을 대어본다. 힘주어 혀를 말아 그 곳에 넣어보고 스치듯 풀어진 혀로 ?아주니 분수처럼 애액이 솟구치며 살아 헤메는 해파리인양 먹이를 찾는 말미잘인양 휘젓고 다니는 혀 끝을 찾아 조갯살이 마구 움직여 댄다.
"아흥, 아흥,,,"
"허허, 왜 그러느냐?"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아흥,,,"
천하명기 어우동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정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일단 오르가즘을 수차례 경험토록 함으로써 그녀의 진기를 어느정도 소모시킬 필요가 있었다.
두 발이 하늘로 향해 벌려지며 거대한 체구의 나를 가운데 밀어 넣기 위해 두 팔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내 좆은 이미 처녀 어우동의 질속으로 질주하고 싶어 꺼덕이며 머리속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다.
벌어진 두 다리 사이에 드러난 입구를 따라 말뚝을 박기 위해 서서히 어우동의 몸에 올라타기 시작하니 치골에 걸리는 감촉이 부드러워 잠시 머뭇거리며 은근한 접촉을 음미해 본다.
눈 앞에 펼쳐진 젖 가슴의 윤택한 계곡을 따라 또 한차례 입술을 대어 살포시 물어보고 ?아보며 두 손 모아 쥐어보기를 반복하지 어우동의 두 다리가 어느새 내 허리깨를 잡아채며 밑으로 방아찌는 형상으로 몰아 붙힌다.
양 팔로 버티며 계곡에 떨어져 휘말려 들지 않기 위해 조심하면서 어우동의 몸부림을 모른척 다시 젖무덤과 목젖을 따라 부드러운 입술을 부벼대고 있다.
가까운 곳에 뜨거운 좆을 느끼면서도 왈칵 덤벼들지 않고 간지러운 감흥만 남긴채 온 몸을 희롱하는 내가 못마땅한지 두 팔로 어깨를 움켜잡고 뜨거운 입술로 어깨를 물어 온다.
이젠 사지가 꽁꽁 묶인 듯 어우동의 힘에 눌려 서서히 좆이 계곡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었다. 서서히 누르며 진입할 때 이미 벌어진 계곡 입구는 애액을 뿜어내며 나를 받아 들이기 위해 더욱 활짝 열어 재끼며 세밀하게 발달한 조갯살이 좆끝을 감싸기 위해 팔짝 뛰어오르는 듯 벌름 거리기 시작했다.
은근히 끝에 힘을 주어 보니 성문이 턱 막혀 있다.
성주가 나를 초청하여 내가 만사 재치고 방문하였으나 버릇없는 수문장이 떡 버티고 앉아 출입을 방해하는 꼴이 한방에 날려 버려야 겠다는 심보로 변하게 한다.
나는 질타하듯 수문장을 발로 뻥 질러대며 성문을 열어 재켰다.
"아~악" 수문장은 커다란 비명 소리와 함께 나뒹굴었다.
따끔하는 조혈을 보이며 성문이 활짝 열리자 기다리며 고대하던 성주가 맨발로 뛰쳐나와 나를 반기는 것이 얼싸안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할닥이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달겨들어 나를 붕 띄우고 환대하는 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자궁성에 도달해선 힘차게 북소리 울리고 다시 뒤돌아서서는 온 길을 따라 질 입구에 다다르면 몰려든 수많은 세포가 합창하듯 달겨들어 홀연히 돌아서는 나를 방해하며 다시 자궁성에 입성토록 영접하기를 수천번 반복하니 성주는 이 빠진 사람처럼 혈색을 잃고 기진맥진하기 시작했다. 적절한 때를 찾아 자궁성에 도달할 때 길게 나팔 소리 들리는 순간 나는 온 힘을 다해 큰 북을 마구 두둘기며 진한 밤꽃냄새가 진동하는 정액을 분출해 버렸다.
눈자위가 돌아간 듯 넋을 놓고 있던 어우동은 끝없이 밀려드는 정액을 한 방울도 버릴 수 없는 듯 마구 빨아들이며 쫄깃한 질구와 이어진 자궁까지의 만 백성들을 동원하여 내 좆을 편안케 하고 있었다.
"아?, 아~, 아~..."
길게 여운지며 어우동은 두 눈을 감아 버렸다.
후희를 즐기는 내 스타일은 비록 어우동이 혼절해 버렸더라도 아쉬운 여운을 위해 자궁 깊이 묻어두며 탈진한 그 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볍게 안아 쓸어주며 거친 손가락을 빗질하듯 삼단같은 머리결을 따라 쓸어주고 있다.
출렁이는 물결이 어우동의 목에 찰랑이자 굽혔던 발을 좌우로 벌리며 욕탕의 벽면에 머리를 기대는 자태는 조금전 개체로 탄생하여 물을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익숙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아, 따뜻해."
"기분이 좋으냐?"
"네, 편안하고 아늑한 것이 예전에 느껴 보지 못한 야릇한 감흥을 주옵니다."
"이제 몸을 한번 풀어봐야 하니 욕탕 밖으로 나오너라."
탕 밖으로 나온 어우동은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기에는 신경도 못쓴채 젖가슴을 두 손으로 가려 보려고 하지만 워낙 젖살이 통통하여 미처 가려지지 않은 구석이 많았다.
은밀한 채모가 송두리채 드러나며 작은 동산을 가린 소나무 가지처럼 울창하게 뻗어 있다.
"이리와서 눕거라."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걸음으로 물침대 위에 몸을 걸치는 어우동의 자태는 가히 천하일색이라 호색한인 내 마음 조차 벌써 진탕되고 있었다.
가녀린 어깨위로 한 팔을 올려놓고 바짝 다가가선 앵두같은 입술을 살며시 찍어 눌렀다. 쫀득한 느낌이 신선한 향내와 함께 코속을 파고 들었다. 다물어진 입술 사이로 부드럽게 혀를 넣어보니 달갑게 맞이 하는 또 다른 혀와 엉켜 버린다.
호흡을 멈추며 빨아대는 혀의 놀림에 다른 한 팔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껴 안아 본다.
개미허리를 안아쥔 듯 가슴팍에 빨려드는 어우동의 작은 몸은 어느새 딱딱한 돌기가 된 젖꼭지를 내 가슴에 부딪혀 온다.
찰진 젖가슴이 뭉쿨 다가오며 허리께를 조여주는 이상으로 몸에 안기는 것이 일품이라 어느새 호흡이 정지된 듯 강한 자극이 머리에 치달았다.
어깨에 올려진 팔을 목 뒤로 두며 머리채를 살짝 뒤로 젖히며 목젖에 뜨거운 입술을 가져가니 온몸이 팔딱이며 진동하듯 까물어치는 것이 웬만한 장정이라면 그 모습에 벌써 을 빼앗겨 버릴 것 같았다.
어느새 내 입술은 목줄기를 따라 뽀로뚱 솟아 버린 젖꼭지를 희롱하며 간지럽히고 빨아대니 어우동의 입에서는 단내를 풀풀내며 기묘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한다.
허리를 감았던 팔을 풀러 깊이 패인 배꼽 주변을 맴돌자 난데없이 가녀린 손이 다가와 더 아래 깊은 샘쪽으로 이끌어버린다.
촉촉하게 맺혀 있는 샘물을 찾아 유영하듯 손바닥을 그 곳에 마찰시켜본다. 뜨거움이 펄펄 솟아나며 진득한 애액이 손바닥 가득 묻어난다. 깊게 파인 골을 따라 중지를 이동시켜보니 조갯살이 반란을 일으킨 듯 솟구치며 스치는 손가락을 물어오는 것이 여간 감미로운 것이 아니다.
오소장이 작품을 만들었다.
명기중의 명기라며 조심할 것을 당부한 그 곳은 미쳐 처녀를 뚫기도 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치열함이 있었다.
매끄러운 허벅지로 이동한 손은 무릎위에 머문 채 살짝 조이고 풀며 어우동의 반응을 살폈다. 전혀 감각이 없을 이곳은 오히려 성감대 이상의 간지러움을 전하며 어느새 두 팔이 허우적 거리는 기 현상을 연출한다.
내친김에 천하명기 어우동의 그곳에 날카로운 입술을 대어본다. 힘주어 혀를 말아 그 곳에 넣어보고 스치듯 풀어진 혀로 ?아주니 분수처럼 애액이 솟구치며 살아 헤메는 해파리인양 먹이를 찾는 말미잘인양 휘젓고 다니는 혀 끝을 찾아 조갯살이 마구 움직여 댄다.
"아흥, 아흥,,,"
"허허, 왜 그러느냐?"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아흥,,,"
천하명기 어우동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정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일단 오르가즘을 수차례 경험토록 함으로써 그녀의 진기를 어느정도 소모시킬 필요가 있었다.
두 발이 하늘로 향해 벌려지며 거대한 체구의 나를 가운데 밀어 넣기 위해 두 팔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내 좆은 이미 처녀 어우동의 질속으로 질주하고 싶어 꺼덕이며 머리속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다.
벌어진 두 다리 사이에 드러난 입구를 따라 말뚝을 박기 위해 서서히 어우동의 몸에 올라타기 시작하니 치골에 걸리는 감촉이 부드러워 잠시 머뭇거리며 은근한 접촉을 음미해 본다.
눈 앞에 펼쳐진 젖 가슴의 윤택한 계곡을 따라 또 한차례 입술을 대어 살포시 물어보고 ?아보며 두 손 모아 쥐어보기를 반복하지 어우동의 두 다리가 어느새 내 허리깨를 잡아채며 밑으로 방아찌는 형상으로 몰아 붙힌다.
양 팔로 버티며 계곡에 떨어져 휘말려 들지 않기 위해 조심하면서 어우동의 몸부림을 모른척 다시 젖무덤과 목젖을 따라 부드러운 입술을 부벼대고 있다.
가까운 곳에 뜨거운 좆을 느끼면서도 왈칵 덤벼들지 않고 간지러운 감흥만 남긴채 온 몸을 희롱하는 내가 못마땅한지 두 팔로 어깨를 움켜잡고 뜨거운 입술로 어깨를 물어 온다.
이젠 사지가 꽁꽁 묶인 듯 어우동의 힘에 눌려 서서히 좆이 계곡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었다. 서서히 누르며 진입할 때 이미 벌어진 계곡 입구는 애액을 뿜어내며 나를 받아 들이기 위해 더욱 활짝 열어 재끼며 세밀하게 발달한 조갯살이 좆끝을 감싸기 위해 팔짝 뛰어오르는 듯 벌름 거리기 시작했다.
은근히 끝에 힘을 주어 보니 성문이 턱 막혀 있다.
성주가 나를 초청하여 내가 만사 재치고 방문하였으나 버릇없는 수문장이 떡 버티고 앉아 출입을 방해하는 꼴이 한방에 날려 버려야 겠다는 심보로 변하게 한다.
나는 질타하듯 수문장을 발로 뻥 질러대며 성문을 열어 재켰다.
"아~악" 수문장은 커다란 비명 소리와 함께 나뒹굴었다.
따끔하는 조혈을 보이며 성문이 활짝 열리자 기다리며 고대하던 성주가 맨발로 뛰쳐나와 나를 반기는 것이 얼싸안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할닥이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달겨들어 나를 붕 띄우고 환대하는 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자궁성에 도달해선 힘차게 북소리 울리고 다시 뒤돌아서서는 온 길을 따라 질 입구에 다다르면 몰려든 수많은 세포가 합창하듯 달겨들어 홀연히 돌아서는 나를 방해하며 다시 자궁성에 입성토록 영접하기를 수천번 반복하니 성주는 이 빠진 사람처럼 혈색을 잃고 기진맥진하기 시작했다. 적절한 때를 찾아 자궁성에 도달할 때 길게 나팔 소리 들리는 순간 나는 온 힘을 다해 큰 북을 마구 두둘기며 진한 밤꽃냄새가 진동하는 정액을 분출해 버렸다.
눈자위가 돌아간 듯 넋을 놓고 있던 어우동은 끝없이 밀려드는 정액을 한 방울도 버릴 수 없는 듯 마구 빨아들이며 쫄깃한 질구와 이어진 자궁까지의 만 백성들을 동원하여 내 좆을 편안케 하고 있었다.
"아?, 아~, 아~..."
길게 여운지며 어우동은 두 눈을 감아 버렸다.
후희를 즐기는 내 스타일은 비록 어우동이 혼절해 버렸더라도 아쉬운 여운을 위해 자궁 깊이 묻어두며 탈진한 그 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볍게 안아 쓸어주며 거친 손가락을 빗질하듯 삼단같은 머리결을 따라 쓸어주고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