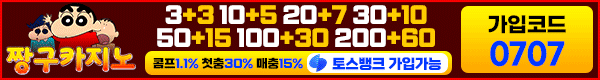애쉬, 조금 더 진한 그레이 - 13부
작성자 정보
- AV야동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314 조회
-
목록
본문
애쉬, 조금 더 진한 그레이 -13부-
난 희망을 본 것일까. 그때 나의 얼굴을 타고 흐르던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태양을 의미하던 것들이 나에게 와서 재를 들쑤신 것일까. 그 재에 다시 불길이 솟아 오르려 했던 것일까. 태양이 나를 불살라버리고 다시 내 모든 것들을 기초부터 건설하려 했던 것일까. 아직 내 안에 희망이, 남아있던 것이었을까. 나는 모르겠다.
어느 날 나는 사전 약속도 없이, 그리고 통보도 없이 그녀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봄의 축복을 받았던 꽃잎들은 이미 떨어져 썩어버린 후였다. 꽃잎엔 짙은 멍이 들어있었고, 그 위로 태양은 일말의 자비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리찍고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내가 경외할 것들은 그곳엔 없었다. 나는 그런 하늘을 견디며 그녀의 오피스텔을 향했다. 왜 그랬을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왜 갔던 것일까. 나의 두 손에 그녀에게 줄 선물과 꽃다발이 들려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때의 난 그녀를 놀래켜 주고 싶은 생각 뿐이었을터. 아마 그것이 전부였을 것이었다. 그렇게 도착한 그녀의 오피스텔. 난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리고,
풀려버린 눈빛. 창밖에 내리쬐던 태양. 나동그라진 약병. 알싸한 향기들. 하얀 슬립. 어눌한 혀. 어그러진 침대. 우울한 공기. 텅 빈 동공. 절망 뒤에 숨어버린 희망.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생각들. 푸르른 알약.
봄도 아닌, 여름도 아닌, 끼여버린 시간들.
여자와의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은 감히 말하지만, 따사로웠다. 태양은 나의 뒤를 따라 천천히 쫓아왔다. 어둠은 어디에도 없었다. 불안은 종식된 듯했고, 희망은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처럼 곧게 뻗어 내 앞에 드러누워 있는 것 같았다. 새로운 시간에 떠오른 태양은 또 다른 세상을 그려내는 것처럼 밝고 찬란했다. 나는 운전하는 중에도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이 차 안에 가득했다. 그림자는 태양을 피해 지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끈질기게 나를 옭아맨 절망이 또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서, 나는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작은 살얼음을 간신히 밟고 서있는 기분이었다. 모든 경계가 저 태양으로 인해 녹아 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희망이었다. 희망은, 그 자체로 나에게 공포였다. 나는 친구가 주었던 염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염주는 어제도, 오늘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손목에 휘감겨 있었다. 왠지, 안심이 되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을 겨우 견뎌내며 운전을 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것은 늦은 오후 무렵이었다. 여자는 밤을 향해 다시 출근을 해야 했다. 옷을 갈아입었고, 자신의 짐을 챙겼다. 여자는 천천히 물건을 꾸렸다. 여자의 행동에는 망설임들이 들러붙어 있었고, 그 망설임들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 망설임의 시선들 속에서 나는 방황하고 있었다. 나는 여자를 잡고 싶었다. 여자가 나에게 선사한 작은 희망의 끈에 대한 보답. 나는 오늘 같이 있자고 얘기하고 싶었다. 가지 않으면 안되겠냐고 묻고 싶었다. 아마 여자의 대답은 그 망설임들 속에 숨어 있지 않았을까. 나는 여자의 희망 속에서 울고 싶었다. 설사 그 울음이 나의 희망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나는 위로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을 새로이 쌓아 올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여자의 망설임을 그 재료로 삼아.
여자는 한참 후에 짐을 다 챙겼다. 챙긴 짐엔 주저함이 묻어 있었다. 여자는 곧바로 나가지 않고 테이블 근처에서 서성거렸다. 여자의 직장은 밤에 묻어 있었는데, 그것은 멀어보였다. 나는 손멱에 걸린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여자의 입이 갈증난 사람처럼 달싹 거렸다. 나 역시 그 달싹거림을 따라 입을 우물거렸다.
저기.
난 생각을 했다. 고민을 했다. 고뇌를 했다. 난 고민에 밀려 더 이상의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여자가 말했다.
저기, 아저씨.
저, 라고 말하는 순간, 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난 핸드폰과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친구였다. 난 핸드폰을 다시 쳐다보고 다시 여자를 쳐다보았다. 건너가야 할 강 옆에서 나를 붙잡는 것들과 나를 보내야 하는 것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모든 것의 가운데 끼인 느낌이었다.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말했다. 그 말이 나의 모든 것을 갈라놓는 말이었는지 그때 나는 왜 몰랐을까.
전화, 받으세요. 아저씨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다시 몰려와 나를 뒤흔드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애써 좋게 생각했다. 어차피 내 친구 아닌가. 그래, 내일이면 또 볼것이고, 안되면 오늘 저녁이라도 여자가 근무하는 룸살롱에 놀러가면 되지 뭐. 그래. 그러면 돼지. 뭐, 별 일이야 있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끄덕임에는 일말의 미안함이 묻어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열었다.
여보세요.
나다, 뭐하냐. 오늘 술 한잔 사주라.
친구의 목소리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여자를 한 번 쳐다보았다. 여자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난감했다. 여자가 나의 표정을 읽었는지,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자를 쳐다 본 후, 눈을 한 번 감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응, 그냥 있어. 어디로 갈까?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태양이 어느새 몰락하며 소멸하려 하고 있었다. 어스름한 어둠이 멀리서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여자는 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사라지는 여자의 뒷모습을 가만히 쳐다만 보았다. 창밖엔 어느새 태양은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아마조네스로 와. 거기 있어.
그래. 알았어.
친구는 전화를 끊었다. 깊은 적막같은 친구의 목소리가 왠지 불안했다. 그리고 또 다시 내 오피스텔을 가득히 둘러싼 어둠이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여자가 사라진 방은 고요했고, 한없는 적막으로 침전하는 듯했다. 나는 모든 것이 두려웠다. 사라진 여자가 두려웠고, 침전된 나의 방이 두려웠고, 적막에 눌려버린 친구의 목소리가 두려웠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방에 불을 켜지 않고 잠시 앉아 있다가, 잠시 후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내가 가야할 곳이 분명했지만, 그 분명한 것들이 너무 두려웠다. 나는 걸음을 옮겼다.
난 희망을 본 것일까. 그때 나의 얼굴을 타고 흐르던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태양을 의미하던 것들이 나에게 와서 재를 들쑤신 것일까. 그 재에 다시 불길이 솟아 오르려 했던 것일까. 태양이 나를 불살라버리고 다시 내 모든 것들을 기초부터 건설하려 했던 것일까. 아직 내 안에 희망이, 남아있던 것이었을까. 나는 모르겠다.
어느 날 나는 사전 약속도 없이, 그리고 통보도 없이 그녀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봄의 축복을 받았던 꽃잎들은 이미 떨어져 썩어버린 후였다. 꽃잎엔 짙은 멍이 들어있었고, 그 위로 태양은 일말의 자비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리찍고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내가 경외할 것들은 그곳엔 없었다. 나는 그런 하늘을 견디며 그녀의 오피스텔을 향했다. 왜 그랬을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왜 갔던 것일까. 나의 두 손에 그녀에게 줄 선물과 꽃다발이 들려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때의 난 그녀를 놀래켜 주고 싶은 생각 뿐이었을터. 아마 그것이 전부였을 것이었다. 그렇게 도착한 그녀의 오피스텔. 난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리고,
풀려버린 눈빛. 창밖에 내리쬐던 태양. 나동그라진 약병. 알싸한 향기들. 하얀 슬립. 어눌한 혀. 어그러진 침대. 우울한 공기. 텅 빈 동공. 절망 뒤에 숨어버린 희망.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생각들. 푸르른 알약.
봄도 아닌, 여름도 아닌, 끼여버린 시간들.
여자와의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은 감히 말하지만, 따사로웠다. 태양은 나의 뒤를 따라 천천히 쫓아왔다. 어둠은 어디에도 없었다. 불안은 종식된 듯했고, 희망은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처럼 곧게 뻗어 내 앞에 드러누워 있는 것 같았다. 새로운 시간에 떠오른 태양은 또 다른 세상을 그려내는 것처럼 밝고 찬란했다. 나는 운전하는 중에도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이 차 안에 가득했다. 그림자는 태양을 피해 지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끈질기게 나를 옭아맨 절망이 또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서, 나는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작은 살얼음을 간신히 밟고 서있는 기분이었다. 모든 경계가 저 태양으로 인해 녹아 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희망이었다. 희망은, 그 자체로 나에게 공포였다. 나는 친구가 주었던 염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염주는 어제도, 오늘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손목에 휘감겨 있었다. 왠지, 안심이 되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을 겨우 견뎌내며 운전을 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것은 늦은 오후 무렵이었다. 여자는 밤을 향해 다시 출근을 해야 했다. 옷을 갈아입었고, 자신의 짐을 챙겼다. 여자는 천천히 물건을 꾸렸다. 여자의 행동에는 망설임들이 들러붙어 있었고, 그 망설임들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 망설임의 시선들 속에서 나는 방황하고 있었다. 나는 여자를 잡고 싶었다. 여자가 나에게 선사한 작은 희망의 끈에 대한 보답. 나는 오늘 같이 있자고 얘기하고 싶었다. 가지 않으면 안되겠냐고 묻고 싶었다. 아마 여자의 대답은 그 망설임들 속에 숨어 있지 않았을까. 나는 여자의 희망 속에서 울고 싶었다. 설사 그 울음이 나의 희망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나는 위로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을 새로이 쌓아 올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여자의 망설임을 그 재료로 삼아.
여자는 한참 후에 짐을 다 챙겼다. 챙긴 짐엔 주저함이 묻어 있었다. 여자는 곧바로 나가지 않고 테이블 근처에서 서성거렸다. 여자의 직장은 밤에 묻어 있었는데, 그것은 멀어보였다. 나는 손멱에 걸린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여자의 입이 갈증난 사람처럼 달싹 거렸다. 나 역시 그 달싹거림을 따라 입을 우물거렸다.
저기.
난 생각을 했다. 고민을 했다. 고뇌를 했다. 난 고민에 밀려 더 이상의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여자가 말했다.
저기, 아저씨.
저, 라고 말하는 순간, 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난 핸드폰과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친구였다. 난 핸드폰을 다시 쳐다보고 다시 여자를 쳐다보았다. 건너가야 할 강 옆에서 나를 붙잡는 것들과 나를 보내야 하는 것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모든 것의 가운데 끼인 느낌이었다.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말했다. 그 말이 나의 모든 것을 갈라놓는 말이었는지 그때 나는 왜 몰랐을까.
전화, 받으세요. 아저씨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다시 몰려와 나를 뒤흔드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애써 좋게 생각했다. 어차피 내 친구 아닌가. 그래, 내일이면 또 볼것이고, 안되면 오늘 저녁이라도 여자가 근무하는 룸살롱에 놀러가면 되지 뭐. 그래. 그러면 돼지. 뭐, 별 일이야 있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끄덕임에는 일말의 미안함이 묻어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열었다.
여보세요.
나다, 뭐하냐. 오늘 술 한잔 사주라.
친구의 목소리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여자를 한 번 쳐다보았다. 여자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난감했다. 여자가 나의 표정을 읽었는지,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자를 쳐다 본 후, 눈을 한 번 감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응, 그냥 있어. 어디로 갈까?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태양이 어느새 몰락하며 소멸하려 하고 있었다. 어스름한 어둠이 멀리서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여자는 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사라지는 여자의 뒷모습을 가만히 쳐다만 보았다. 창밖엔 어느새 태양은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아마조네스로 와. 거기 있어.
그래. 알았어.
친구는 전화를 끊었다. 깊은 적막같은 친구의 목소리가 왠지 불안했다. 그리고 또 다시 내 오피스텔을 가득히 둘러싼 어둠이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여자가 사라진 방은 고요했고, 한없는 적막으로 침전하는 듯했다. 나는 모든 것이 두려웠다. 사라진 여자가 두려웠고, 침전된 나의 방이 두려웠고, 적막에 눌려버린 친구의 목소리가 두려웠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방에 불을 켜지 않고 잠시 앉아 있다가, 잠시 후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내가 가야할 곳이 분명했지만, 그 분명한 것들이 너무 두려웠다. 나는 걸음을 옮겼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