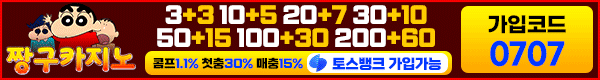애쉬, 조금 더 진한 그레이 - 12부
작성자 정보
- AV야동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010 조회
-
목록
본문
애쉬, 조금 더 진한 그레이 -12부-
사랑해본적 있어요?
나는 호텔 침대에 누워있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하얀 연기가 넘실거리며 사라졌다. 창밖으로 육지에 몸을 비벼대는 파도소리가 아득하게 밀려왔다. 아득함은 나를 천천히 들어올려 창밖으로 빼내려 했지만 나는 경계의 안쪽에 누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공허하게 피워올리는 연기만 바라보았다. 여자는 내 옆에 누워 나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여자는 나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사랑해본적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기는 내 주변을 감싸 안을 듯 몰아가더니 이내 흐트러졌고, 나와 여자를 엎은 이불이 여자의 손길을 따라 사각거렸다. 비울 속에서는 나의 참담한 것들이 들어 있어 내가 몸을 일으키면 나를 따라 절망의 세상으로 다시 복귀할 것만 같았다. 나는 여자의 머리맡으로 내 팔을 밀어 넣으며 말했다.
사랑?
사랑에 관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도 없었다. 사랑은 나를 좀 먹는 바이러스일 뿐이었다. 그리고 사랑에 관한 나의 기억은 이제 단편적인 몇 가지 조각만이 단상斷想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벽에 걸린 새하얀 원피스. 파랗게 질린 푸른 입술. 침대 난간에 묶인 분홍빛 스카프. 아침 햇살을 맞아 새하얗게 빛나던 하얀 곰인형. 참지 못한 고통에 스스로 뜯어내버린 작은 살결들. 누군가의 토사물. 또 누군가의 핏방울. 그리고 익명의 얼굴.
그때 난 사람의 피는 참 깨끗하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다.
없어.
시간을 새벽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다시 떠오를 태양을 생각했다.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것들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나는 달리고 있는 시간의 선두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등 떠밀리며 달리는 기분이었다. 달도 사라져버린 하늘은 이제 바다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구분할 수 없는 경계가 두려웠다.
왜요?
나의 가슴을 쓰다듬고 있던 여자가 한 손으로 머리를 괴더니 내 얼굴 앞에 얼굴을 바싹 들이밀며 다시 말했다. 나는 여자의 시선을 마주보며 말했다.
뭐가?
사랑 안 한 이유,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못해본 거 아니에요?
안 한 것도, 못해본 것도 없어.
왜요?
그딴거 필요없으니까. 그리고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없으니까. 그래서 안 한거야. 그런거 있으면 귀찮기만 해.
나는 몸을 일으키며 다시 담배를 집었다. 그리고 침대 벽에 몸을 기댄 후 불을 붙였다. 담배가 문득 쓰게 느껴졌다. 여자는 다시 내 허벅지에 머리를 베더니 나의 페니스를 가만히 쓸어 만졌다.
그럼 못 해본거네. 안 해본게 아니라.
맘대로 생각해. 못 해본거든, 안 해본거든 상관없으니까.
여자는 다시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다. 여자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정말 사랑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있었던거 같은데.
그딴 거 안키워.
나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여자의 눈이 동그래졌다. 내 목소리에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예?
사랑은 바이러스야. 숙주에 기생하면서 숙주의 모든 것을 소모하고, 파괴해버리는 바이러스. 사랑이란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질병일 뿐이야. 신의 전염병. 일종의 흑사병같은거야.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숙주의 모든 것을 허물고 짓이겨 버리는 전염병. 사랑이란 그 따위 바이러스는 제대로 된 치료제도 없어. 그래서 더 위험해. 알겠어? 모든 병원체는 각각 그에게 맞는 백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그렇지도 않아. 불치병이야. 그래서 더 파괴적이지. 그런 것들은 전부 새로운 치료백신을 개발한 다음 멸균시켜버린 후에 깡그리 제거해 버려야 해.
나의 말에 여자는 질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여자는 말이 없었다. 나는 이불을 밀치듯 여자를 밀어내고 일어서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는 검은 어둠 만이 나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파도를 짓이기며 그들의 비명을 나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붉은 핏빛 같은 횟집의 네온사인이 멀리서 보였다. 나는 창으로 비치는 검은 어둠속의 나를 향해 다시 말했다.
그리고 난, 내 한 몸 챙기는 것도 귀찮아. 사랑 같은 거 키울 여력따윈 내게 없어.
여자는 가민히 있었다. 복잡한 표정. 죽음같은 적막이 잠시 호텔 방에 들어앉았다. 적막의 무게는 너무 무거워서 그 누구도 그것을 들어내지 못할 것 같았다. 여자는 침대에 몸을 비스듬히 내리깔며 누웠다. 나는 어둠에 묻힌 나와 여자와의 거리를 문득 떠올렸다. 거리는 감지되지 않았다. 잠시 후, 적막에 지쳐버린 여자는 풋, 하고 웃더니 나에게 다시 말했다.
아저씨는 좋아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나는 여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나는 알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언 나의 표정에 여자는 다시 엎드린 채 턱을 괴더니 침대에 그을 쓰듯 손가락으로 끼적거리며 중얼거렸다.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관심 있는 건 하나도 없어보이고. 돈이 많아 이것저것 하는 것 같긴 한데, 딱히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긴 돈이 많은 것도 좀 이상하긴 해. 뭐, 하지만 그거야 유산을 받았을수도 있는거고, 또 뭐 내가 알 바로 아니지만. 뭐 어찌되었든 그건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다고 보고 빼더라도. 하여간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그게 아저씨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룸살롱 같은데 다니는 것도, 꼭 도축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다 죽어가는 표정을 하면서 다니고. 하기 싫은거 억지로 하는 사람처럼 말이지.
여자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도대체 좋아하는게 뭐예요?
여자는 스승에게 대답을 구하려는 제자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나는 갑자기 두려웠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어느날 갑자기 여자에게 날 걸 그대로 드러나는 환상이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모든 것을 절단하고 싶었다. 나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 여자에게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마. 그러다 다쳐.
나의 말에 여자는 갑자기 깔깔대며 웃었다. 여자는 나를 손가락으로 한 번 가리키더니 아저씨도 그런 말 할 줄 알아요? 나 왜 이렇게 웃기니, 하고는 침대에 발까지 구르며 계속 웃었다. 그런 여자의 모습은 당황스러웠지만, 어찌되었든 나의 안쪽을 보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난 괜찮았다. 나는 한결 기분이 편안했다. 나는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는 픽, 하고 웃고 말았다. 그러자 여자는 어? 아저씨, 웃었따. 웃었죠? 그죠? 웃은거 맞죠? 하더니 침대를 기어 나에게 다가와 내 등을 뒤에서 끌어안더니 계속 조르듯 말했다.
말해줘봐요. 도대체 좋아하는게 뭐예요?
나는 여자에게 안겨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리, 싫지는 않았다. 이상했다. 나는 지금 나를 안은 이 여자가 불안하면서도 좋았다. 아니, 좋았다 라고 쓰고 다시 지웠다. 그것들은 내가 긍정하기 힘든 것들이었다. 나는 애써 기존의 나의 것들을 불려내려 애썼다. 여자는 나의 몸을 계속 흔들며 말했다.
말해줘요, 아저씨. 나 궁금하단 말이예요.
나는 창밖 어둠을 보며 말했다.
섹스.
그래. 섹스. 열꽃이 피고 심장이 불타는 축제같은 섹스가 아닌 모든 상념을 불태울 수 있는 처절한 화형식 같은 섹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섹스. 아무것도 남지 않아 허무의 절정에 다다른 섹스. 온 몸에 힘이 빠져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서 생각조차 마비된 상태의 절정. 그리고 그 후에 짖쳐오는 텅 빈 공허함. 모든 것이 끝난 후 세상에 오직 홀로 존재하는 허무함. 존재감조차 사라져버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따위는 전혀 생각지도 고려치도 않아도 되는 후희後戱. 멈춰버린 시간 속에 내던져져 온 우주를 떠돌며 부유하는 미아같은, 경계조차 불확실한 우주를 떠돌아 절대로 그곳을 탈출할 수도, 달아나지도 못하는, 그렇게, 허물어진 섹스. 푸른 빛조차 어둠에 색이 바래는, 공허함과 죽음 조차 빛이 바랜 허무감으로 옷을 입은 정액. 그 허무감이 가득한 여자의 질.
나의 말에 여자는 예? 뭐예요, 재미없게, 라고 하더니 다시 침대에 몸을 벌렁 뉘였다. 난 창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어둠을 마주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맞는거야. 나는 몸을 돌려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갑자기 장난감을 뺏긴 아이처럼 샐쭉한 얼굴을 하고선 침대에 누워 흥미를 잃어버린 자신의 손가락을 침대 바닥에 비벼대고 있었다.
아저씨, 솔직히 얘기 해봐요. 여자랑 자본 것도 내가 처음이죠? 그쵸?
그래, 네가 처음이야.
나는 아무 표정없이 대꾸했다. 그러자 여자는 뭐야? 아저씨 진짜 재미없어, 라고 하더니 다시 아무리 농담이지만 아저씨는 자존심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라고 했다.
자존심? 그런거 없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엔 어스름한 태양이 수면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려내려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쳐다보며 천천히,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저 태양이 뜨고, 내일이 되며, 희망은, 정말, 올까?
나직한 나의 말에 여자는 생각이 잠긴 듯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나는 나의 얼굴에 누군가가 축축한 손수건을 덮는 환상을 느꼈다. 잠시 후, 여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등 뒤로 여자의 따뜻한 느낌이 전해져 왔다.
그럼요. 잘될 거예요. 전부 다.
여자가 뒤에서 나를 안으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내 얼굴을 덮은 누군가의 손수건을 벗겨내고 싶었지만, 손수건은 더욱 축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심장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다. 그 느낌에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재건축을 위한 붕괴. 과연 그것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여자의 말과 태양의 광채 앞에서 나는 주저앉고 싶었다. 태양은 느릿느릿 기어오르더니 마침내 찬란한 빛을 나에게 쏟아내었다. 나를 안고 있던 여자가 그 빛을 온 몸으로 맞으며 나에게 다시 말했다.
다 잘될 거예요.
사랑해본적 있어요?
나는 호텔 침대에 누워있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하얀 연기가 넘실거리며 사라졌다. 창밖으로 육지에 몸을 비벼대는 파도소리가 아득하게 밀려왔다. 아득함은 나를 천천히 들어올려 창밖으로 빼내려 했지만 나는 경계의 안쪽에 누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공허하게 피워올리는 연기만 바라보았다. 여자는 내 옆에 누워 나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여자는 나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사랑해본적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기는 내 주변을 감싸 안을 듯 몰아가더니 이내 흐트러졌고, 나와 여자를 엎은 이불이 여자의 손길을 따라 사각거렸다. 비울 속에서는 나의 참담한 것들이 들어 있어 내가 몸을 일으키면 나를 따라 절망의 세상으로 다시 복귀할 것만 같았다. 나는 여자의 머리맡으로 내 팔을 밀어 넣으며 말했다.
사랑?
사랑에 관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도 없었다. 사랑은 나를 좀 먹는 바이러스일 뿐이었다. 그리고 사랑에 관한 나의 기억은 이제 단편적인 몇 가지 조각만이 단상斷想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벽에 걸린 새하얀 원피스. 파랗게 질린 푸른 입술. 침대 난간에 묶인 분홍빛 스카프. 아침 햇살을 맞아 새하얗게 빛나던 하얀 곰인형. 참지 못한 고통에 스스로 뜯어내버린 작은 살결들. 누군가의 토사물. 또 누군가의 핏방울. 그리고 익명의 얼굴.
그때 난 사람의 피는 참 깨끗하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다.
없어.
시간을 새벽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다시 떠오를 태양을 생각했다.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것들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나는 달리고 있는 시간의 선두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등 떠밀리며 달리는 기분이었다. 달도 사라져버린 하늘은 이제 바다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구분할 수 없는 경계가 두려웠다.
왜요?
나의 가슴을 쓰다듬고 있던 여자가 한 손으로 머리를 괴더니 내 얼굴 앞에 얼굴을 바싹 들이밀며 다시 말했다. 나는 여자의 시선을 마주보며 말했다.
뭐가?
사랑 안 한 이유,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못해본 거 아니에요?
안 한 것도, 못해본 것도 없어.
왜요?
그딴거 필요없으니까. 그리고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없으니까. 그래서 안 한거야. 그런거 있으면 귀찮기만 해.
나는 몸을 일으키며 다시 담배를 집었다. 그리고 침대 벽에 몸을 기댄 후 불을 붙였다. 담배가 문득 쓰게 느껴졌다. 여자는 다시 내 허벅지에 머리를 베더니 나의 페니스를 가만히 쓸어 만졌다.
그럼 못 해본거네. 안 해본게 아니라.
맘대로 생각해. 못 해본거든, 안 해본거든 상관없으니까.
여자는 다시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다. 여자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정말 사랑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있었던거 같은데.
그딴 거 안키워.
나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여자의 눈이 동그래졌다. 내 목소리에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예?
사랑은 바이러스야. 숙주에 기생하면서 숙주의 모든 것을 소모하고, 파괴해버리는 바이러스. 사랑이란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질병일 뿐이야. 신의 전염병. 일종의 흑사병같은거야.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숙주의 모든 것을 허물고 짓이겨 버리는 전염병. 사랑이란 그 따위 바이러스는 제대로 된 치료제도 없어. 그래서 더 위험해. 알겠어? 모든 병원체는 각각 그에게 맞는 백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그렇지도 않아. 불치병이야. 그래서 더 파괴적이지. 그런 것들은 전부 새로운 치료백신을 개발한 다음 멸균시켜버린 후에 깡그리 제거해 버려야 해.
나의 말에 여자는 질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여자는 말이 없었다. 나는 이불을 밀치듯 여자를 밀어내고 일어서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는 검은 어둠 만이 나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파도를 짓이기며 그들의 비명을 나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붉은 핏빛 같은 횟집의 네온사인이 멀리서 보였다. 나는 창으로 비치는 검은 어둠속의 나를 향해 다시 말했다.
그리고 난, 내 한 몸 챙기는 것도 귀찮아. 사랑 같은 거 키울 여력따윈 내게 없어.
여자는 가민히 있었다. 복잡한 표정. 죽음같은 적막이 잠시 호텔 방에 들어앉았다. 적막의 무게는 너무 무거워서 그 누구도 그것을 들어내지 못할 것 같았다. 여자는 침대에 몸을 비스듬히 내리깔며 누웠다. 나는 어둠에 묻힌 나와 여자와의 거리를 문득 떠올렸다. 거리는 감지되지 않았다. 잠시 후, 적막에 지쳐버린 여자는 풋, 하고 웃더니 나에게 다시 말했다.
아저씨는 좋아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나는 여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나는 알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언 나의 표정에 여자는 다시 엎드린 채 턱을 괴더니 침대에 그을 쓰듯 손가락으로 끼적거리며 중얼거렸다.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관심 있는 건 하나도 없어보이고. 돈이 많아 이것저것 하는 것 같긴 한데, 딱히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긴 돈이 많은 것도 좀 이상하긴 해. 뭐, 하지만 그거야 유산을 받았을수도 있는거고, 또 뭐 내가 알 바로 아니지만. 뭐 어찌되었든 그건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다고 보고 빼더라도. 하여간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그게 아저씨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룸살롱 같은데 다니는 것도, 꼭 도축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다 죽어가는 표정을 하면서 다니고. 하기 싫은거 억지로 하는 사람처럼 말이지.
여자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도대체 좋아하는게 뭐예요?
여자는 스승에게 대답을 구하려는 제자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나는 갑자기 두려웠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어느날 갑자기 여자에게 날 걸 그대로 드러나는 환상이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모든 것을 절단하고 싶었다. 나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 여자에게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마. 그러다 다쳐.
나의 말에 여자는 갑자기 깔깔대며 웃었다. 여자는 나를 손가락으로 한 번 가리키더니 아저씨도 그런 말 할 줄 알아요? 나 왜 이렇게 웃기니, 하고는 침대에 발까지 구르며 계속 웃었다. 그런 여자의 모습은 당황스러웠지만, 어찌되었든 나의 안쪽을 보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난 괜찮았다. 나는 한결 기분이 편안했다. 나는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는 픽, 하고 웃고 말았다. 그러자 여자는 어? 아저씨, 웃었따. 웃었죠? 그죠? 웃은거 맞죠? 하더니 침대를 기어 나에게 다가와 내 등을 뒤에서 끌어안더니 계속 조르듯 말했다.
말해줘봐요. 도대체 좋아하는게 뭐예요?
나는 여자에게 안겨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리, 싫지는 않았다. 이상했다. 나는 지금 나를 안은 이 여자가 불안하면서도 좋았다. 아니, 좋았다 라고 쓰고 다시 지웠다. 그것들은 내가 긍정하기 힘든 것들이었다. 나는 애써 기존의 나의 것들을 불려내려 애썼다. 여자는 나의 몸을 계속 흔들며 말했다.
말해줘요, 아저씨. 나 궁금하단 말이예요.
나는 창밖 어둠을 보며 말했다.
섹스.
그래. 섹스. 열꽃이 피고 심장이 불타는 축제같은 섹스가 아닌 모든 상념을 불태울 수 있는 처절한 화형식 같은 섹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섹스. 아무것도 남지 않아 허무의 절정에 다다른 섹스. 온 몸에 힘이 빠져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서 생각조차 마비된 상태의 절정. 그리고 그 후에 짖쳐오는 텅 빈 공허함. 모든 것이 끝난 후 세상에 오직 홀로 존재하는 허무함. 존재감조차 사라져버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따위는 전혀 생각지도 고려치도 않아도 되는 후희後戱. 멈춰버린 시간 속에 내던져져 온 우주를 떠돌며 부유하는 미아같은, 경계조차 불확실한 우주를 떠돌아 절대로 그곳을 탈출할 수도, 달아나지도 못하는, 그렇게, 허물어진 섹스. 푸른 빛조차 어둠에 색이 바래는, 공허함과 죽음 조차 빛이 바랜 허무감으로 옷을 입은 정액. 그 허무감이 가득한 여자의 질.
나의 말에 여자는 예? 뭐예요, 재미없게, 라고 하더니 다시 침대에 몸을 벌렁 뉘였다. 난 창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어둠을 마주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맞는거야. 나는 몸을 돌려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갑자기 장난감을 뺏긴 아이처럼 샐쭉한 얼굴을 하고선 침대에 누워 흥미를 잃어버린 자신의 손가락을 침대 바닥에 비벼대고 있었다.
아저씨, 솔직히 얘기 해봐요. 여자랑 자본 것도 내가 처음이죠? 그쵸?
그래, 네가 처음이야.
나는 아무 표정없이 대꾸했다. 그러자 여자는 뭐야? 아저씨 진짜 재미없어, 라고 하더니 다시 아무리 농담이지만 아저씨는 자존심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라고 했다.
자존심? 그런거 없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엔 어스름한 태양이 수면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려내려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쳐다보며 천천히,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저 태양이 뜨고, 내일이 되며, 희망은, 정말, 올까?
나직한 나의 말에 여자는 생각이 잠긴 듯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나는 나의 얼굴에 누군가가 축축한 손수건을 덮는 환상을 느꼈다. 잠시 후, 여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등 뒤로 여자의 따뜻한 느낌이 전해져 왔다.
그럼요. 잘될 거예요. 전부 다.
여자가 뒤에서 나를 안으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내 얼굴을 덮은 누군가의 손수건을 벗겨내고 싶었지만, 손수건은 더욱 축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심장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다. 그 느낌에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재건축을 위한 붕괴. 과연 그것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여자의 말과 태양의 광채 앞에서 나는 주저앉고 싶었다. 태양은 느릿느릿 기어오르더니 마침내 찬란한 빛을 나에게 쏟아내었다. 나를 안고 있던 여자가 그 빛을 온 몸으로 맞으며 나에게 다시 말했다.
다 잘될 거예요.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