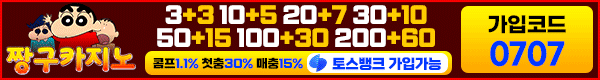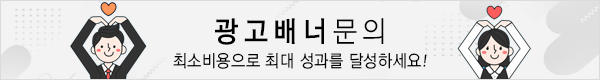P읍에서 - 상편
작성자 정보
- AV야동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3,567 조회
-
목록
본문
이 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10% 팩트와 90%의 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안계시길 바라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기타 여러 명칭들은 허구로 만들어진 것임을 밝혀 둡니다.
등장인물
김영훈(나, 37세, 임시계약직)
정은영(직원, 30세)
이은진(직원, 34세)
강대승(직원, 42세)
그리고 기타 등등
고향에 내려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연로하데다가 건강이 안좋아지신 부모님께 효도 해보겠다고 반듯하게 다니던 서울 직장에 사표를 내고 직원들의 안타까운 환송회를 마친 후 유유히 내려와 농사일을 도와드리면서 지낸지 3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나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어떤 직장이든 잡아야 했다.
그러나 시골이라 직장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고 어쩌다 구한 직장이래야 몇 개월 못 가서 때려치우기 일쑤였다. 적성에도 맞지 않았고 서울서 직장 다니던 그 스타일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터라 몸으로 떼우는 일은 내게 녹록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닐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시골에 내려가겠다고 하자 이별통보를 해왔던 것이다.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 했으나 절대로 죽어도 시골에서는 못살겠다는 그녀의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기사, 나도 시골이 좋아서 내려가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서울에서도 충분히 좋은 직장에서 월급 받으며 인정 받으면서 편하게 다니다가 시골가서 농사 짓고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일을 한다는 게 시골 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미지의 땅에 처음 발을 내딛는 개척자의 심정이었을게다. 나도 이해한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안타깝고 괘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처음 만나서 사귈 때는 죽어도 못 헤어질 것처럼 대하고 행동하더니만 사람이라는 게 마음은 그리도 간사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져 버린 상황에서 미련을 두는 것 또한 나의 미래에 대한 배신일 것 같아서 다 정리를 하고 내려왔던 것이다. 그리고 나도 몇 년 동안 햇볕에 그을리고 손바닥에 물집도 잡혀가면서 농촌의 스타일대로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랬다. 그 말대로 나도 차츰 여기 생활에 적응을 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었다. 농사를 지어서는 결코 돈벌이가 되지 않았다. 힘이 들면 그 댓가가 나름대로 따라와줘야 뭔가 일할 맛도 나는 법인데 농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특별한 기술이나 특색있는 농사가 아니면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땅을 벗 삼아 살다가 가는 것이 전부인 것이다.
직장을 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 개월에 걸친 직장 구하기 대작전 끝에 비록 임시 계약직이지만 군청에 입사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나마 이렇게 구하게 된 것도 오랜 생활 이 마을의 토박이로 살아오신 부모님의 인맥을 통해서 여러 높은 관공서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특혜를 입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계약 조건은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경력이 쌓인 후에 결원이 생기면 그 때부터 차근차근 일반 직원 자리부터 밟아 올라가는 조건이었다. 물론 중간에 그만두어야 할 가능성도 존재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조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 내가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일단 찾았고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적응해 나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현실 속의 임무이자 목표였다.
처음 배정받은 곳은 각 마을과 군청 내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책임지는 자치행정과였다. 첫 날 출근 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멍하니 분주히 끌려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업무 파악도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고 계장님의 환영식 제안에 따라서 내 환영회가 열렸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우리 부서 직원들은 다 남아서 자그마한 갈비집에 모여서 식사를 했다. 고기를 먹다 보면 자연스레 술도 돌게 되고 다들 술이 들어가면서부터 말들도 많아지고 얼굴이 벌개진 채 흥분하는 사람, 고개 처박고 술과 고기에 집중하는 사람, 계장님 옆에 붙어서 열심히 손바닥 비비는 사람 등등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천태만상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 직원들은 8명에 계장님까지 해서 총 9명이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은 바로 내 자리 옆에서 같이 앉아서 일을 하는 이은진이라는 여자직원과 칸막이 하나를 마주 보고 있는 강대승이라는 남자직원과 정은영이라는 여자직원이었다. 이은진이라는 여자직원은 오늘 하루 지켜 보니 별로 말이 많지 않고 약간 성격이 까칠하기도 한 그런 여자였다. 그러나 내 관심은 마주보고 있는 직원인 강대승과 정은영이었다. 너무나 다정해 보이는 것이 부부이거나 커플일 거라는 예상을 하게 했다. 회식을 마친 후 노래방에 가자는 계장님을 따라서 간 일부 나이 많은 직원 몇 명 빼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흩어졌다.
다음날, 8시 50분 쯤 출근을 하니 다른 파트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해 있었다. 나는 신입이면서 늦게 간 것 같아 뻘쭘해져서 조용히 자리로 찾아갔는데 내 옆자리 이은진씨가 아직 출근을 안한 것 같았다. 그리고 보니 맞은 편에 있는 강대승씨도 출근을 안한 것 같고 정은영씨만 뭐가 그리 바쁜지 무슨 서류철을 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분주히 다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자세히 보니 정은영씨는 블라우스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키가 168센치쯤 되어 보이는데 날씬하기까지 해서 옷 맵시도 그렇고 몸매가 환히 드러나는 게 왠지 모르게 나에게 어떠한 감이 오게 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된 촉으로 되기 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9시 넘어서자 강대승씨가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고 잠시 후에 이은진씨가 가방을 들고 들어온다. 단화에 정장바지 스타일의 깔끔한 모습이다. 그런데 표정이 별로 좋지 못하다. 자기 자리에 가서 가방을 책상 위에 놓더니 내 옆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책상에 고개를 박고 있었다. 아직 여기 생활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내 사수 역할을 해주는 이은진씨가 저렇게 고개를 박고 꿈쩍을 안하니 뻘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몇 분 지나지 않아 고개를 든 은진씨가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맞은 편 강대승씨 자리를 스윽 보더니 자리에 없음을 확인하고 나를 불러내었다.
“잠깐 저 좀 보실래요?”
난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나 싶어 움찔했으나 크게 찔릴 만한 잘못도 한 기억이 전혀 없기에 따라 나섰다. 먼저 앞서서 나간 은진씨는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더니 복도 끝부분 쯤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리는 곳으로 갔다. 거기는 지금 막 업무가 시작된 시간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거기서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구석으로 데려간다. 손이 따뜻했다. 그러나 눈빛은 별로 따뜻하지가 않다. 분명 무슨 일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 같았다.
“영훈씨, 우리 맞은 편에 앉아 있는 남자 직원 있죠?”
“네, 그 강대승인가 하는 그 분 말이죠?”
“네.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리고 되도록 부딪히는 일 없도록 하시구요. 왠만하면 근처에 있지 마세요.”
“엥? 왜요?”
첫인상은 차갑고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였다고 해도 아직 사람의 본 모습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무조건적으로 나의 적으로 돌리는 것은 내게 좋은 일은 아니기에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다.
그러자 갑자기 은진씨가 나를 끌어당기더니 서서히 은진씨의 얼굴이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엄마야!’
그러면서 나는 살며시 눈을 감았다. 은진씨의 얼굴이 눈 앞에 아른거리면서 은진씨의 그림자가 나를 덮었다. 그리고 몇 초의 시간이 몇 십 분처럼 느끼질 때쯤...
※자유게시판도 자주 들러주세요. 5월 17일(일) 오늘 밤 이벤트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품 구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부탁 드립니다.
등장인물
김영훈(나, 37세, 임시계약직)
정은영(직원, 30세)
이은진(직원, 34세)
강대승(직원, 42세)
그리고 기타 등등
고향에 내려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연로하데다가 건강이 안좋아지신 부모님께 효도 해보겠다고 반듯하게 다니던 서울 직장에 사표를 내고 직원들의 안타까운 환송회를 마친 후 유유히 내려와 농사일을 도와드리면서 지낸지 3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나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어떤 직장이든 잡아야 했다.
그러나 시골이라 직장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고 어쩌다 구한 직장이래야 몇 개월 못 가서 때려치우기 일쑤였다. 적성에도 맞지 않았고 서울서 직장 다니던 그 스타일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터라 몸으로 떼우는 일은 내게 녹록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닐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시골에 내려가겠다고 하자 이별통보를 해왔던 것이다.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 했으나 절대로 죽어도 시골에서는 못살겠다는 그녀의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기사, 나도 시골이 좋아서 내려가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서울에서도 충분히 좋은 직장에서 월급 받으며 인정 받으면서 편하게 다니다가 시골가서 농사 짓고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일을 한다는 게 시골 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미지의 땅에 처음 발을 내딛는 개척자의 심정이었을게다. 나도 이해한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안타깝고 괘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처음 만나서 사귈 때는 죽어도 못 헤어질 것처럼 대하고 행동하더니만 사람이라는 게 마음은 그리도 간사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져 버린 상황에서 미련을 두는 것 또한 나의 미래에 대한 배신일 것 같아서 다 정리를 하고 내려왔던 것이다. 그리고 나도 몇 년 동안 햇볕에 그을리고 손바닥에 물집도 잡혀가면서 농촌의 스타일대로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랬다. 그 말대로 나도 차츰 여기 생활에 적응을 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었다. 농사를 지어서는 결코 돈벌이가 되지 않았다. 힘이 들면 그 댓가가 나름대로 따라와줘야 뭔가 일할 맛도 나는 법인데 농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특별한 기술이나 특색있는 농사가 아니면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땅을 벗 삼아 살다가 가는 것이 전부인 것이다.
직장을 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 개월에 걸친 직장 구하기 대작전 끝에 비록 임시 계약직이지만 군청에 입사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나마 이렇게 구하게 된 것도 오랜 생활 이 마을의 토박이로 살아오신 부모님의 인맥을 통해서 여러 높은 관공서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특혜를 입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계약 조건은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경력이 쌓인 후에 결원이 생기면 그 때부터 차근차근 일반 직원 자리부터 밟아 올라가는 조건이었다. 물론 중간에 그만두어야 할 가능성도 존재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조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 내가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일단 찾았고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적응해 나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현실 속의 임무이자 목표였다.
처음 배정받은 곳은 각 마을과 군청 내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책임지는 자치행정과였다. 첫 날 출근 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멍하니 분주히 끌려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업무 파악도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고 계장님의 환영식 제안에 따라서 내 환영회가 열렸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우리 부서 직원들은 다 남아서 자그마한 갈비집에 모여서 식사를 했다. 고기를 먹다 보면 자연스레 술도 돌게 되고 다들 술이 들어가면서부터 말들도 많아지고 얼굴이 벌개진 채 흥분하는 사람, 고개 처박고 술과 고기에 집중하는 사람, 계장님 옆에 붙어서 열심히 손바닥 비비는 사람 등등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천태만상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 직원들은 8명에 계장님까지 해서 총 9명이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은 바로 내 자리 옆에서 같이 앉아서 일을 하는 이은진이라는 여자직원과 칸막이 하나를 마주 보고 있는 강대승이라는 남자직원과 정은영이라는 여자직원이었다. 이은진이라는 여자직원은 오늘 하루 지켜 보니 별로 말이 많지 않고 약간 성격이 까칠하기도 한 그런 여자였다. 그러나 내 관심은 마주보고 있는 직원인 강대승과 정은영이었다. 너무나 다정해 보이는 것이 부부이거나 커플일 거라는 예상을 하게 했다. 회식을 마친 후 노래방에 가자는 계장님을 따라서 간 일부 나이 많은 직원 몇 명 빼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흩어졌다.
다음날, 8시 50분 쯤 출근을 하니 다른 파트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해 있었다. 나는 신입이면서 늦게 간 것 같아 뻘쭘해져서 조용히 자리로 찾아갔는데 내 옆자리 이은진씨가 아직 출근을 안한 것 같았다. 그리고 보니 맞은 편에 있는 강대승씨도 출근을 안한 것 같고 정은영씨만 뭐가 그리 바쁜지 무슨 서류철을 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분주히 다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자세히 보니 정은영씨는 블라우스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키가 168센치쯤 되어 보이는데 날씬하기까지 해서 옷 맵시도 그렇고 몸매가 환히 드러나는 게 왠지 모르게 나에게 어떠한 감이 오게 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된 촉으로 되기 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9시 넘어서자 강대승씨가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고 잠시 후에 이은진씨가 가방을 들고 들어온다. 단화에 정장바지 스타일의 깔끔한 모습이다. 그런데 표정이 별로 좋지 못하다. 자기 자리에 가서 가방을 책상 위에 놓더니 내 옆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책상에 고개를 박고 있었다. 아직 여기 생활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내 사수 역할을 해주는 이은진씨가 저렇게 고개를 박고 꿈쩍을 안하니 뻘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몇 분 지나지 않아 고개를 든 은진씨가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맞은 편 강대승씨 자리를 스윽 보더니 자리에 없음을 확인하고 나를 불러내었다.
“잠깐 저 좀 보실래요?”
난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나 싶어 움찔했으나 크게 찔릴 만한 잘못도 한 기억이 전혀 없기에 따라 나섰다. 먼저 앞서서 나간 은진씨는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더니 복도 끝부분 쯤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리는 곳으로 갔다. 거기는 지금 막 업무가 시작된 시간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거기서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구석으로 데려간다. 손이 따뜻했다. 그러나 눈빛은 별로 따뜻하지가 않다. 분명 무슨 일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 같았다.
“영훈씨, 우리 맞은 편에 앉아 있는 남자 직원 있죠?”
“네, 그 강대승인가 하는 그 분 말이죠?”
“네.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리고 되도록 부딪히는 일 없도록 하시구요. 왠만하면 근처에 있지 마세요.”
“엥? 왜요?”
첫인상은 차갑고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였다고 해도 아직 사람의 본 모습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무조건적으로 나의 적으로 돌리는 것은 내게 좋은 일은 아니기에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다.
그러자 갑자기 은진씨가 나를 끌어당기더니 서서히 은진씨의 얼굴이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엄마야!’
그러면서 나는 살며시 눈을 감았다. 은진씨의 얼굴이 눈 앞에 아른거리면서 은진씨의 그림자가 나를 덮었다. 그리고 몇 초의 시간이 몇 십 분처럼 느끼질 때쯤...
※자유게시판도 자주 들러주세요. 5월 17일(일) 오늘 밤 이벤트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품 구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부탁 드립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