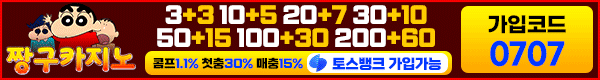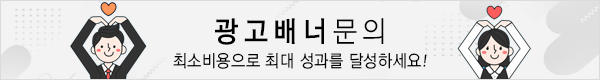원더러 - 아들의 이야기 - 2부
작성자 정보
- AV야동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3,047 조회
-
목록
본문
==;; 무지 재미 없으리라 생각되는 글입니다;;
작가가 조금 질질 끄는 성격이라, H신 다운 H 신은 한 50 쪽은 넘어가야 나오는 군요;;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실 분만 즐겨 주시면...음...
...==;;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
“흥, 그런데 머리색깔은 지적 안 하네. 본인이 찔려서 그런 건가?”
“아니. 고양이는 원래 노란 털이 귀엽거든, 난.”
또 나왔다 -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
‘저주받은 피야! 저주받은 일족이라고!’
고양이 -
‘저 기분나쁜 눈을 봐! 낮에는 저렇게 사람의 눈이지만 - ’
고양이 -
‘저건 괴물이야! 인간이 아니라고!’
고양이 -
‘죽여버려! 어서 죽여버려!!’
"...한번만 더 고양이 소리를 입 밖에 내면...죽여버리겠어...”
츠카사는 나지막이 경고를 하며 규에게 송곳니를 살짝 드러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진지한 경고에도 규는 츠카사를 웃으며 바라볼 뿐이었다. 유난히 날카로운 송곳니를 바라보던 규는, 그 쪽으로 손가락을 뻗으며 말했다.
“그렇게 송곳니를 내 보이는 건, 나를 깨물겠다는 뜻인가? 하지만 난, 송곳니를 드러내 보이면서 우는 고양이가 제일 귀엽던데...그런 고양이에게 더 접근했을 때 취하는 행동은 두 가지야. 다가오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덥썩 깨물어 버리던가...아니면 몸을 비벼대면서 아양을 떨던가.”
츠카사는 자신의 입으로 다가오는 손가락을 보고 약간 화가 나 그 손을 뿌리치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
‘...어?...어?!...뭐, 뭐야!!’
움직일 수 없었다. 누가 자신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소리라도 지르려고 했지만, 혀도 굳어버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눈동자와 혀를 제외한 안면 근육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알 바 아닌 건지, 아니면 그런 사정을 그가 만들어 낸 것인지, 규의 손가락은 천천히 츠카사의 입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부드러운 입술인데...좋은 고양이를 보는 조건 중 하나지, 천박하지 않고 우아한 입술 - ”
‘흑...’
완전히 굳어버려 저항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입술을 천천히, 부드럽게 잡아당기는 규의 손가락은 아주 섬세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엄지로 천천히 입술을 쓰는가 했더니, 검지로 이빨와 입술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천천히 안쪽을 쓸고 아랫입술을 다시 잡아당기는 가 하면 윗입술을 세 손가락으로 주무르는 등, 그 기민한 움직임에 츠카사는 처음 느끼는 이상한 기분에 빠져들고 있었다. 아무도 지금껏 츠카사에게 그런 에로틱한 행위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옛날의 한 명을 빼면. 그 사람이 만져 놓은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이미 잊어버린 감각이...
또 원래 여자는, 그리고 고양이는 이런 어루만짐을 더 좋아하기도 한다.
“혀 역시 중요해. 우유나 물을, 크림을 떠먹는 혀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섬세하면서도,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어야지.”
‘읍...윽...’
어느 새 츠카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츠카사의 몸은 규의 애무에 익숙해지고, 뒤에 이어질 일을 기대하게 된 듯 했다. 눈은 분명히 뜨고 있지만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츠카사는 몸의 안 쪽이 아닌 피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디 한번 신축성을 시험해 볼까.”
‘하...악...’
규가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츠카사의 혀를 잡고 살며시 잡아당기자 츠카사는 몸의 피부가 아니라,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호오, 신축성은 좋아. 촉촉함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그럼 유연성이 있나 한 번 봐야겠는걸.”
‘흑...학...’
규는 엄지와 검지를 눕혀서 츠카사의 혀를 넓게 잡고는 손목을 돌려 츠카사의 혀를 마치 열쇠 돌리듯 천천히 돌려보았다.
“흠,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 이거 정말 재미있는 일인걸, 길 잃은 고양이가 알고 보니 페르시안 종의 고급이었다니 말이야.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키우고 싶지 않겠어?”
규는 손가락을 빼면서 천천히 말했다. 그는 츠카사의 침이 흠뻑 묻은 자신의 손가락을 잠시 쳐다보더니, 그 손가락을 츠카사의 볼에 스윽하고 문대어 침을 닦았다.
천천히 정신이 돌아오는 츠카사였지만, 방금 전의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지 숨결을 가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분홍빛 기운이 돌고 있었다.
‘몸...아직도 움직일 수 없네...’
츠카사의 마음 속에서는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었다. 앞에 있는 이 재수없는 놈을 때려주겠다는 마음과, 자신도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조금 더 즐겨보자고 말하고 있는 마음. 그리고 지금은, 자신도 모르는 새 후자 쪽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후였다.
‘자, 잠깐!!’
츠카사는 몸의 자유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오히려 약간 안심하고, 앞에 벌어질 일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자 퍼뜩 놀라면서 잠시 동안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고 애를 썼다.
‘아, 아니야...이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런 건...이런 건...’
뭐가 아니야?
‘이런...것...’
뭐가 아니야?
‘...모르...겠...어...’
츠카사는 천천히 무리한 저항을 그만두고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그녀의 숨결은 더욱 더 가빠져만 갔다. 앞으로의 일에 대한 기대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한 듯 했다. 반쯤 풀린 눈을 한 채 숨을 가쁘게 내쉬는 츠카사는 도저히 평소의 츠카사로는 볼 수 없었다.
“뭐 하냐, 고양이? 다 죽어가는 눈빛으로 숨을 내쉬고.”
“어?...아...”
어느 새, 몸의 자유는 돌아와 있었다. 어색한 자세로 굳어져 있던 팔은 다시 주인의 명령을 듣고 있었다. 꼼짝없이 굳어져 있었던 목도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더불어, 반 아이들의 시선은 다시금 모두 츠카사에게로 쏠려 있었다.
“저기, 아카기 군, 얼굴도 붉고 숨도 거칠군...몸이 아프다면 양호실로 내려가보지 않겠나?”
“아, 아니요...괜찮습니다.”
츠카사는 목 언저리까지 붉어진 얼굴로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보아하니 규가 자신에게 한 일은 모르는 것 같았다. 단지 자신의 상태를 보고 지레 짐작했을 뿐인가. 그렇다면 다행이지.
다시 수업이 진행되자, 츠카사는 약간 쭈뼛거리면서 규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생글거리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규의 눈과 마주치자, 츠카사는 약간 당황하면서 고개를 팩 돌려버렸다.
아무리 상대하고, 아무리 공격하려고 애써도 너무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았다. 게다가 이게 싸움이었다면, 자신은 이미 복부에 블로우를 한 방 먹은 셈이었다. 이렇게 까지 당한 마당에 더 이상 덤빌 마음도 도저히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덤비지 않을 수는 없다. 더 이상 당할 순 없다.
그러면서도...
약간은 아쉬운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 일까.
“저기...”
“음? 왜, 고양이?”
“...끄...”
“끄 뭐?”
츠카사는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내가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
“끝...이야?”
규는 잠시 츠카사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듯이 눈만 껌뻑거리면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입가에 찍 찢어진 미소를 걸고 한손을 뻗어 츠카사의 머리를 토닥이며 말했다.
“귀족 고양이는 못 되겠네, 응? 우아한 고양이는 애정을 구걸하지 않는 법이거든. 뭐, 하지만 나는 우아한 걸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하니, ‘귀여운’ 고양이라면 마음에 들지.”
“무, 무슨!!”
안 그래도 빨개진 얼굴인데, 도대체 얼마나 더 빨갛게 만들어야 이 녀석은 속이 풀리는 걸까. 츠카사는 킥킥대며 웃는 규의 옆에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아직 1교시 70분이 30분만 흘렀는데도 버겁다...할 수 없다, 도망쳐야지.
“저...선생님...아무래도,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아카기 군, 내려가 봐.”
다행인 일이지만, 수학 선생은 그래도 츠카사를 꽤나 좋아하는 편이었다. 사실 선생님들 중 반은 츠카사를 싫어하고, 반은 츠카사를 좋아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학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학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선생님들 중 어느 누구도 츠카사가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자신의 입술과 혀를 마음대로 만지작거리게 내버려 두었다고는 생각 못할 것이다...사실 반 강제기는 했지만.
‘나 참...나도 무슨 생각인거야...’
스스로 생각해도 ‘끝이야’ 라고 물어본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찌 보면 성희롱에 가까운 행위, 아니 강간에 조금 더 가까운 행위를 당하고 난 뒤에도 더 원한다는 듯이...더 자신을 만져달라는 듯이 말을 하다니...도대체 내가 왜 그랬던 거지?
아무튼, 더 이상 그 녀석 옆에 있는 건 견딜 수 없어...
츠카사는 천천히 비척대면서 양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중간에 양호 선생이 뭔가 물어보기는 했지만, 대충 둘러대고 대답한 뒤 침대에 누웠다.
정말로 자고 싶었다. 하지만 쉽사리 잠들 수도 없는 것이, 남들 앞이 아닌가. 위에서도 말했듯이, 츠카사는 나름대로 모범생이었다. 불순한(?) 목적의 양호실 이용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남들 앞에서 자는 게 뭐가 불안하냐...고 묻는 다면, 그건 츠카사에게 물어보시라.
“아무리 누워서 자도 그 자세로 바뀌니까...”
“그 자세라면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거야?”
“...너, 너?!”
작가가 조금 질질 끄는 성격이라, H신 다운 H 신은 한 50 쪽은 넘어가야 나오는 군요;;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실 분만 즐겨 주시면...음...
...==;;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
“흥, 그런데 머리색깔은 지적 안 하네. 본인이 찔려서 그런 건가?”
“아니. 고양이는 원래 노란 털이 귀엽거든, 난.”
또 나왔다 -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
‘저주받은 피야! 저주받은 일족이라고!’
고양이 -
‘저 기분나쁜 눈을 봐! 낮에는 저렇게 사람의 눈이지만 - ’
고양이 -
‘저건 괴물이야! 인간이 아니라고!’
고양이 -
‘죽여버려! 어서 죽여버려!!’
"...한번만 더 고양이 소리를 입 밖에 내면...죽여버리겠어...”
츠카사는 나지막이 경고를 하며 규에게 송곳니를 살짝 드러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진지한 경고에도 규는 츠카사를 웃으며 바라볼 뿐이었다. 유난히 날카로운 송곳니를 바라보던 규는, 그 쪽으로 손가락을 뻗으며 말했다.
“그렇게 송곳니를 내 보이는 건, 나를 깨물겠다는 뜻인가? 하지만 난, 송곳니를 드러내 보이면서 우는 고양이가 제일 귀엽던데...그런 고양이에게 더 접근했을 때 취하는 행동은 두 가지야. 다가오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덥썩 깨물어 버리던가...아니면 몸을 비벼대면서 아양을 떨던가.”
츠카사는 자신의 입으로 다가오는 손가락을 보고 약간 화가 나 그 손을 뿌리치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
‘...어?...어?!...뭐, 뭐야!!’
움직일 수 없었다. 누가 자신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소리라도 지르려고 했지만, 혀도 굳어버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눈동자와 혀를 제외한 안면 근육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알 바 아닌 건지, 아니면 그런 사정을 그가 만들어 낸 것인지, 규의 손가락은 천천히 츠카사의 입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부드러운 입술인데...좋은 고양이를 보는 조건 중 하나지, 천박하지 않고 우아한 입술 - ”
‘흑...’
완전히 굳어버려 저항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입술을 천천히, 부드럽게 잡아당기는 규의 손가락은 아주 섬세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엄지로 천천히 입술을 쓰는가 했더니, 검지로 이빨와 입술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천천히 안쪽을 쓸고 아랫입술을 다시 잡아당기는 가 하면 윗입술을 세 손가락으로 주무르는 등, 그 기민한 움직임에 츠카사는 처음 느끼는 이상한 기분에 빠져들고 있었다. 아무도 지금껏 츠카사에게 그런 에로틱한 행위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옛날의 한 명을 빼면. 그 사람이 만져 놓은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이미 잊어버린 감각이...
또 원래 여자는, 그리고 고양이는 이런 어루만짐을 더 좋아하기도 한다.
“혀 역시 중요해. 우유나 물을, 크림을 떠먹는 혀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섬세하면서도,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어야지.”
‘읍...윽...’
어느 새 츠카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츠카사의 몸은 규의 애무에 익숙해지고, 뒤에 이어질 일을 기대하게 된 듯 했다. 눈은 분명히 뜨고 있지만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츠카사는 몸의 안 쪽이 아닌 피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디 한번 신축성을 시험해 볼까.”
‘하...악...’
규가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츠카사의 혀를 잡고 살며시 잡아당기자 츠카사는 몸의 피부가 아니라,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호오, 신축성은 좋아. 촉촉함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그럼 유연성이 있나 한 번 봐야겠는걸.”
‘흑...학...’
규는 엄지와 검지를 눕혀서 츠카사의 혀를 넓게 잡고는 손목을 돌려 츠카사의 혀를 마치 열쇠 돌리듯 천천히 돌려보았다.
“흠,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 이거 정말 재미있는 일인걸, 길 잃은 고양이가 알고 보니 페르시안 종의 고급이었다니 말이야.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키우고 싶지 않겠어?”
규는 손가락을 빼면서 천천히 말했다. 그는 츠카사의 침이 흠뻑 묻은 자신의 손가락을 잠시 쳐다보더니, 그 손가락을 츠카사의 볼에 스윽하고 문대어 침을 닦았다.
천천히 정신이 돌아오는 츠카사였지만, 방금 전의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지 숨결을 가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분홍빛 기운이 돌고 있었다.
‘몸...아직도 움직일 수 없네...’
츠카사의 마음 속에서는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었다. 앞에 있는 이 재수없는 놈을 때려주겠다는 마음과, 자신도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조금 더 즐겨보자고 말하고 있는 마음. 그리고 지금은, 자신도 모르는 새 후자 쪽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후였다.
‘자, 잠깐!!’
츠카사는 몸의 자유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오히려 약간 안심하고, 앞에 벌어질 일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자 퍼뜩 놀라면서 잠시 동안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고 애를 썼다.
‘아, 아니야...이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런 건...이런 건...’
뭐가 아니야?
‘이런...것...’
뭐가 아니야?
‘...모르...겠...어...’
츠카사는 천천히 무리한 저항을 그만두고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그녀의 숨결은 더욱 더 가빠져만 갔다. 앞으로의 일에 대한 기대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한 듯 했다. 반쯤 풀린 눈을 한 채 숨을 가쁘게 내쉬는 츠카사는 도저히 평소의 츠카사로는 볼 수 없었다.
“뭐 하냐, 고양이? 다 죽어가는 눈빛으로 숨을 내쉬고.”
“어?...아...”
어느 새, 몸의 자유는 돌아와 있었다. 어색한 자세로 굳어져 있던 팔은 다시 주인의 명령을 듣고 있었다. 꼼짝없이 굳어져 있었던 목도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더불어, 반 아이들의 시선은 다시금 모두 츠카사에게로 쏠려 있었다.
“저기, 아카기 군, 얼굴도 붉고 숨도 거칠군...몸이 아프다면 양호실로 내려가보지 않겠나?”
“아, 아니요...괜찮습니다.”
츠카사는 목 언저리까지 붉어진 얼굴로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보아하니 규가 자신에게 한 일은 모르는 것 같았다. 단지 자신의 상태를 보고 지레 짐작했을 뿐인가. 그렇다면 다행이지.
다시 수업이 진행되자, 츠카사는 약간 쭈뼛거리면서 규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생글거리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규의 눈과 마주치자, 츠카사는 약간 당황하면서 고개를 팩 돌려버렸다.
아무리 상대하고, 아무리 공격하려고 애써도 너무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았다. 게다가 이게 싸움이었다면, 자신은 이미 복부에 블로우를 한 방 먹은 셈이었다. 이렇게 까지 당한 마당에 더 이상 덤빌 마음도 도저히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덤비지 않을 수는 없다. 더 이상 당할 순 없다.
그러면서도...
약간은 아쉬운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 일까.
“저기...”
“음? 왜, 고양이?”
“...끄...”
“끄 뭐?”
츠카사는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내가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
“끝...이야?”
규는 잠시 츠카사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듯이 눈만 껌뻑거리면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입가에 찍 찢어진 미소를 걸고 한손을 뻗어 츠카사의 머리를 토닥이며 말했다.
“귀족 고양이는 못 되겠네, 응? 우아한 고양이는 애정을 구걸하지 않는 법이거든. 뭐, 하지만 나는 우아한 걸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하니, ‘귀여운’ 고양이라면 마음에 들지.”
“무, 무슨!!”
안 그래도 빨개진 얼굴인데, 도대체 얼마나 더 빨갛게 만들어야 이 녀석은 속이 풀리는 걸까. 츠카사는 킥킥대며 웃는 규의 옆에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아직 1교시 70분이 30분만 흘렀는데도 버겁다...할 수 없다, 도망쳐야지.
“저...선생님...아무래도,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아카기 군, 내려가 봐.”
다행인 일이지만, 수학 선생은 그래도 츠카사를 꽤나 좋아하는 편이었다. 사실 선생님들 중 반은 츠카사를 싫어하고, 반은 츠카사를 좋아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학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학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선생님들 중 어느 누구도 츠카사가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자신의 입술과 혀를 마음대로 만지작거리게 내버려 두었다고는 생각 못할 것이다...사실 반 강제기는 했지만.
‘나 참...나도 무슨 생각인거야...’
스스로 생각해도 ‘끝이야’ 라고 물어본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찌 보면 성희롱에 가까운 행위, 아니 강간에 조금 더 가까운 행위를 당하고 난 뒤에도 더 원한다는 듯이...더 자신을 만져달라는 듯이 말을 하다니...도대체 내가 왜 그랬던 거지?
아무튼, 더 이상 그 녀석 옆에 있는 건 견딜 수 없어...
츠카사는 천천히 비척대면서 양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중간에 양호 선생이 뭔가 물어보기는 했지만, 대충 둘러대고 대답한 뒤 침대에 누웠다.
정말로 자고 싶었다. 하지만 쉽사리 잠들 수도 없는 것이, 남들 앞이 아닌가. 위에서도 말했듯이, 츠카사는 나름대로 모범생이었다. 불순한(?) 목적의 양호실 이용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남들 앞에서 자는 게 뭐가 불안하냐...고 묻는 다면, 그건 츠카사에게 물어보시라.
“아무리 누워서 자도 그 자세로 바뀌니까...”
“그 자세라면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거야?”
“...너, 너?!”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